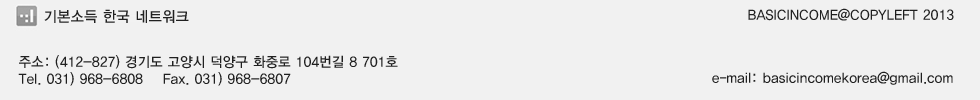제목과 내용을 좀 편집했는데, 몇가지 아쉬운 점도 있지만... 그런대로 잘 된 편입니다.
공유복지의 정수, 기본소득시선1

필자 곽노완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HK교수
지난해 10월 4일 스위스의 시민단체 ‘기본소득 이니셔티브’가 12만 명 이상의 서명을 담은 기본소득 국민발의를 연방내각에 제출했다는 내용이 국내 주요 일간지에 소개되면서 국내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공론화가 시작됐다. 기본소득이 국민발의 형식을 거침에 따라 스위스는 2년 후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발의가 채택된다면 스위스는 전체 국민이 제대로 된 기본소득을 보장받는 첫 번째 나라가 된다. 국민발의를 주도한 시민운동가들은 성인 1인당 2500 스위스프랑(한화 300만원 정도) 정도의 월 기본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액수는 스위스 1인당 GDP의 41% 정도에 해당하며, 우리보다 빅맥 지수가 약 2배 높은 스위스의 물가수준을 감안하더라도 적지 않은 금액이다.
1인당 300만원의 기본소득이 보장된다면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가입하고 있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에 따르면, 기본소득은 재산과 소득 심사 없이 또 노동요구 없이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조건 없이 지급되는 소득이다.
이처럼 기존의 연금 내지 실업부조 등 노동연계적인 선별복지 패러다임을 전복하여 새로운 보편복지 패러다임의 정수를 보여주는 기본소득은 그저 실현 불가능한 꿈에 불과한 것일까? 스위스의 기본소득 국민발의는 그저 지나가는 이벤트에 불과한 것일까?
스위스 시민운동가들의 주장처럼 GDP의 40% 정도를 기본소득에 쏟아 부을 정도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경제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가 우선 문제가 될 것이다. 경제적인 차원만 고려한다면 “문제가 된다.”는 게 맞다. 그 재원이 적자재정처럼 없는 데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생산된 GDP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스위스 의회가 기본소득을 헌법에 명기하는 헌법 개정을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결정한 지난 4일 베른 스위스 연방의회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800만 스위스 국민을 상징하는 5라펜 동전 800만개를 쏟아붓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사진 ⓒ swissinfo.ch)
스위스 의회가 기본소득을 헌법에 명기하는 헌법 개정을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결정한 지난 4일 베른 스위스 연방의회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800만 스위스 국민을 상징하는 5라펜 동전 800만개를 쏟아붓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사진 ⓒ swissinfo.ch) 스위스의회가 기본소득을 헌법에 명기하는 헌법 개정을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결정한 지난 4일 베른 스위스 연방의회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800만 스위스 국민을 상징하는 5라펜 동전 800만개를 쏟아붓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사진 www.nzz.ch)
스위스의회가 기본소득을 헌법에 명기하는 헌법 개정을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결정한 지난 4일 베른 스위스 연방의회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800만 스위스 국민을 상징하는 5라펜 동전 800만개를 쏟아붓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사진 www.nzz.ch)
경제적인 차원의 또 다른 문제는 기본소득이 베짱이를 양산하여 GDP를 줄이고 마침내 자신의 재원을 갉아먹음으로써 사회를 지속불가능한 상태로 빠뜨릴지 모른다는 것일 게다. 그런데 현대 자본주의 국가의 가처분 GDP를 살펴보면, 노동소득 대 자본(불로)소득의 명목비율이 6 대 4(우리나라)에서 7 대 3(서유럽) 정도에 달하며, 증권양도차익 등 금융투기소득과 지하경제에서의 소득까지 고려하면 4 대 6 정도로 불로소득이 노동소득을 압도한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그렇다면 불로소득의 일부를 기본소득으로 전환할 경우, 노동소득을 건드리지 않고도, 다시 말해 노동유인을 해치지 않고도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더구나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투기나 불로소득을 극소화시킨 사회에서 기본소득 이상의 소득을 얻기 위한 최적의 방법은 생산성이 높은 노동에 종사하는 일일 것이다. 이는 기본소득이 생산성이 높은 노동 유인을 제고한다는 것을 뜻한다. 곧 기본소득을 내장한 경제체제는 불로(투기)소득 극대화로 노동유인을 갉아먹는 오늘날의 자본주의보다 경제적으로 지속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기본소득이 실현 가능할지의 여부는 그 사회의 사회적 가치관이 얼마나 변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2년 후로 예정된 스위스의 국민투표가 통과되느냐 마느냐의 여부는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는 스위스 국민들의 변화열망이 얼마나 크냐에 달려 있다는 뜻이다. 직접민주주의 전통이 강한 스위스에서는 사회적 지지도가 정치적인 실현가능성으로 직결되기에 더더욱 그러한다. 스위스에서는 아직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인 인지도와 지지도가 이웃나라 독일처럼 높지 않지만, 약 2년 후의 국민투표 시점까지 기본소득에 대한 인지도와 지지도는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민투표에서 과반의 지지를 얻어낼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할 수 있다.
기본소득의 기본 개념은 자원과 편익의 공유
우리나라라고 해서 기본소득이 멀기만 한 것은 아니다. 부분적이지만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현물기본소득은 이미 우리의 일부가 되어 있으며 지난 대선을 전후해서 대학 반값등록금이 목전의 과제로 떠올랐다. 박근혜 정부가 검토 중인 기초연금도 원래 공약대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조건 없이 매월 20만원씩 지급된다면 금액이 적긴 하지만 일종의 노인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예산이 급증할 것이라는 핑계로 이 원안을 70%의 노령인구에게만 10만원부터 20만원까지 차등지급하는 방안으로 선회한 것은 참으로 아쉬운 일이다.
그런데 기초연금 차등지급 기준을 두고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청와대 비서실 측이 소득비례 기준과 국민연금 수급액 기준으로 대립한 것은 사실 문제의 사족을 둘러싼 대립에 불과하다. 양측 모두 기초연금의 필요예산을 과대계상하면서 원안대로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20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데서는 차이가 없었다.
진영 전 복지부 장관은 공약 원안대로 집행할 경우 2014년에는 6조원, 2020년에는 26조4천억원, 2040년에는 161조3천억원 등으로 예산이 급증하기 때문에 공약대로 실현할 수 없다고 공표했다. 하지만 통계청의 추계대로 2020년과 2040년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각각 808만명과 1700만 명으로 급증한다 해도 보편적인 기초연금 예산은 월 20만원 현가로 계산할 때 각각 19조4천억원과 40조원에 불과하다. 당시 진영 전 장관은 1인당 기초연금이 매년 5.5% 수준으로 인상된다고 보며 예산을 추계했다. 하지만 2007년~2013년의 평균 물가상승률이 2.5% 수준임을 감안할 때 5.5%의 인상률은 과대하게 추산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노인 70%에게 10만원~20만원씩 차등지급할 때조차 필요예산이 2060년에는 228조원에 달한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이 역시 인상률을 5.5%로 과대 계상한 금액이다.
뜻이 있는 자는 길을 찾고 뜻이 없는 자는 핑곗거리를 찾는다. 정부에서 핑계거리를 찾으려하지 않고 원안대로 기초연금을 실현할 현실적인 길을 찾고자 한다면 길이 보일 것이다. 우리가 맨날 북유럽 복지국가의 뒤꽁무니만 따라가야 하는가? 늦게 시작했지만 무상급식, 무상보육에 대해서는 북유럽과 견줄 정도로 선진적이지 않은가? 무상급식에서 그랬듯 이젠 우리가 모범적인 선진국의 비전과 길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 뒤따라가기만 하다보면 ‘짝퉁 선진국’에서 헤어나기 쉽지 않다.
또한 무상급식의 예에서 보듯, 기본소득은 중앙정부 차원이 아닌 지자체 차원에서도 다양하게 시도할 수 있다. 특히 현물기본소득은 전국 차원보다 지자체 차원에서 더 적절하게 시행할 수 있다. 거주자의 현물 필요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중앙정부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의 원칙이 공유(共有)자원의 확대와 이로부터 유래하는 편익의 공유임을 감안할 때, 다가올 지자체 선거에서 현물기본소득의 한 형태로서 대중교통의 단계적 공유화(무상화)가 보육의 공유화(무상화)와 더불어 새롭게 제기된다면 어떨까. 이렇듯 기본소득은 여러 차원과 경로를 통해 우리 사회의 일부가 되고 비전이 될 수 있다. 나는 기본소득이야말로 보편복지의 어머니이자 정수라고 본다. 이젠 복지 분야에서도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그럼 수많은 새로운 길과 비전이 열리고 복지의 새로운 추동력이 생기지 않겠는가.
곽노완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HK교수